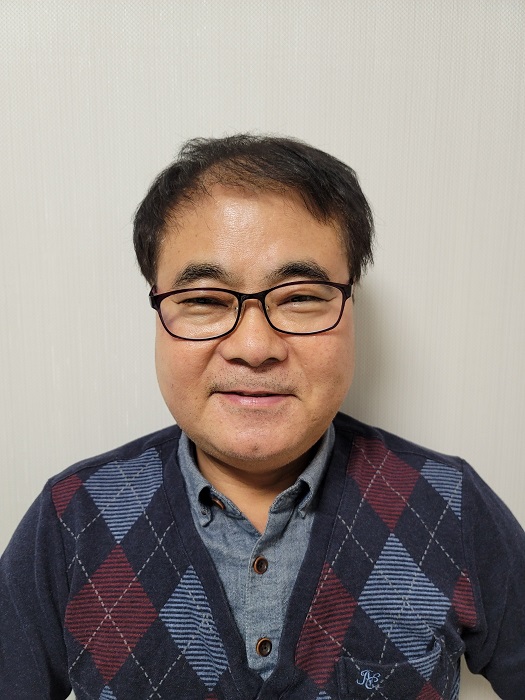[인터뷰] 조혁연 초빙교수 "소가 누워있는 모습 '와우산' 청주 우암산의 본래 지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4.13 댓글0건본문
■ 출연 : 조혁연 충북대 사학과 초빙교수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라디오 충북역사 기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라디오 충북역사기행’ 코너입니다. 오늘도 조혁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혁연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은 가축, ‘소’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주셨습니다. 과거 같으면 요즘이 한참 논밭을 갈아야하는 시기인데, 우리 역사에서 가축 소는 언제부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됐을까요?
▶조혁연 :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는 무리지어 이동생활을 하다보니 주거지가 동굴이나 ‘막집’이었습니다, 막 지은 집. 그러다가 대략 1만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경을 시작하였습니다. 농경생활을 하다보니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집에서 소, 돼지 등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가 우리 역사에서 가축으로 길러지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입니다.
▷연현철 : 우리 역사 중에서 소와 관련된 풍속이나 제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풍속에 대해서 소개해주실건가요?
▶조혁연 : 부족연맹국가단계인 고구려나 부여에는 공통적으로 ‘우제점법’이 성행했습니다. 우제점법은 불에 그을린 소 발굽을 이용해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 고구려나 부여 사람들은 불에 그을린 발굽이 붙어 있으면 길하다, 벌어지면 흉하다고 이렇게 점을 쳤습니다. ‘우제’할 때의 ‘제’는 발굽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구제역은 발굽짐승의 입이나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병이죠.
▷연현철 :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소는 축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무척 소중한 가축이었을건데, 우경, 그러니까 소를 이용한 논밭갈이는 언제 우리 역사에 등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혁연 : 역사 문헌상 신라 지증왕 때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서기 6세기 무렵으로, 학자들은 이때부터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는 부자 농가만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상태서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니 생산력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소는 현대인 1980년대까지도 축력과 육류생산 때문에 농촌 사회의 경제력 1호 역할을 했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 그런지, 소와 관련된 지명이 전국적으로 많죠. 충북도내에는 소와 관련된 지명으로 어떤 지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혁연 : 청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우암산’이죠. 그런데 청주 우암산의 본래 지명은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조선시대까지 ‘와우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제가 1935년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하면서 ‘와우산’과 청주대 근처에 ‘용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글자씩을 따, ‘우암산’으로 개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왜식 지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지만 소가 노동력과 육류생산 때문에 농촌사회 경제력 1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재밌는 표현이 충북도내에도 많이 존재한다면서요?
▶조혁연 : 먼저 ‘배냇소’가 있습니다. 달리 ‘씨암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나 소를 먹일 사람이 없는 집에서 이때 남에게 암송아지를 남에게 주었다가, 2년 정도 뒤에 그 암송아지가 어미소가 되면, 낳은 송아지는 길러준 농부에게 주고, 자기 소는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육비를 주고, 일정기간 ‘위탁 사육'을 한 셈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배냇소, 씨암소, 우리 도내에 또 어우리소라는 풍습이 있습니까?
▶조혁연 : 네.‘어우리소’는요, 달리 ‘병작소’라고도 불렀는데요. 배냇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나 소를 먹일 환경이 안 될 경우, 다른 집에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주고, 그 소가 어미소가 되면, 이것을 팔아서, 생겨난 송아지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반씩 나눠 갖는 풍습입니다. 즉, 벼농사 ‘병작’ 개념과 거의 같은데요. 송아지를 제공한 사람, 즉 자본가에게 살짝 유리한 풍습이었습니다.
▷연현철 : 네. ‘어우리소, 이번에는 또 우리 고장 농촌에는 ‘도지소’라는 개념도 존재했다고요? 이건 또 어떤 풍습입니까?
▶조혁연 :’도지소’는 달리 ‘삯소’, 또는 ‘윤돌소’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풍속은 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봄부터 가을까지 소를 사육합니다. 그 대신 그 소를 그 기간동안 자기가 부려먹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공짜는 없죠. 소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때 삯을 내야했습니다. 그 삯의 형태는 처음부터 올바르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든지 아니면 돌아갈 때 대략 쌀 세 가마, 또는 소등에 떡을 실어 보내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도지소’, 이번엔 ‘종무소’라는 풍습은 또 어떤 풍습입니까?
▶조혁연 : 네. 쉽게 얘기하면 ‘씨받이소’인데요, 달리 ‘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종무소는 씨를 받는 황소겠죠? 대체로 마을마다 한 마리씩 마련해 두거나 혹 군청에서 사주기도 했습니다. 즉, 종무소를 가진 농부는 다른 집의 암소에 교미를 시켜주고, 그 대가로 대략 콩 한 말을 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무소, 즉 황소는요 체격이 크고, 거칠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이 종무소를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젊고 건장한 농부만이 종무소를 잘 다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종무소 대신 인공수정을 하고 있죠.
▷연현철 : 그렇군요. 교수님, 소에도 ‘수양’ 즉 ‘양자’ 개념이 존재했다면서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조혁연 : 그런 소를 ‘수양소’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양자를 들이듯, 다른 사람의 소를 데려다가 대신 사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암소만을 대신 사육했습니다.‘수양소’ 개념은 대신 사육하는 암소가 첫 번에 이어 두 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그 두 번째 송아지는 길러준 농가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풍습을 말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농사를 지을 때 소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필수였죠. 그런데 소가 없는 가난한 농가가 적지 않았죠.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혁연 : ‘보도치’라는 개념이 존재했는데요. 이 풍습은 소 없는 집에서, 소 있는 집의 논밭을, 그집 소의 축력을 이용해, 자신의 노동력, 즉 품으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집 즉 부유한 집의 소를 빌려다가, 자신의 논밭을 시간 나면 갈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조건없이 소를 하루 빌리면, 그 농부는 ‘이틀’ 일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소가 최소한 농부 두 명 몫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현철 : 그러네요. 소를 하루를 빌리면, 농부는 이틀의 일을 도와줘야한다는 거. 농부들은 소를 부릴 때 독특한 부림말을 사용하잖아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조혁연 : 많이 들었을텐데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을 과거 시골에서는 ‘밭갈애비’라고 불렀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충북 고장 밭갈애비는 ‘이려’, ‘워워’, ‘어뎌어뎌’, ‘무러무러’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려’는 소에게 직진, 앞으로 가라, ‘워워’는 정지, ‘어뎌어뎌’는 좌우로 회전하라, 돌아라, ‘무러무러’는 후진, 즉 뒤로 가라, 이런 소말이었습니다.
▷연현철 : 재미있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와 관련된 풍습, 여러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혁연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라디오 충북 역사 기행 ‘조혁연’교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